- [성경본문] 로마서9:1-13 개역개정
-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
2. (1절에 포함됨)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제공: 대한성서공회
김치선과 삼백만부흥운동의 의의
로마서 9:1~13
이 종전 교수
1. 들어가는 말
김치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만큼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해방 직후 그가 주도했던 삼백만부흥운동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삼백만부흥운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그 실체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장로교회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김치선이 주류(主流) 교단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면서 그의 존재감도 함께 역사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 직후 그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삼백만부흥운동에 대한 관심도 함께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 실체가 분명한 이 운동과 이 운동을 주도한 김치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한국교회사연구에 남겨진 하나의 과제이다. 한국교회사에서 이 운동에 대한 언급은 곳곳에 나타난다. 하지만 이 운동의 실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진한 상태로서 필자가 본 학회지에 기 발표한 “삼백만부흥운동의 성격과 실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유일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방 직후에 전개됐던 삼백만부흥운동이 한국교회사에서의 위치와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며 과제이다.
지금까지 삼백부흥운동이라는 말보다는 일반적으로 삼백만구령운동으로 일컬어져왔다. 그러나 이 운동의 정확한 명칭은 삼백만부흥운동이다. 따라서 앞으로 삼백만부흥운동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와 함께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이 운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해방 직후 한국교회 재건사와 부흥운동사의 바른 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사에서 이 운동이 다뤄지지 않고 있음은 해방 직후 한국교회사 연구에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의 한국교회는 재건과 함께 신학적인 대립과 교권쟁취를 위한 다툼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수한 복음운동을 통한 부흥을 주도했던 김치선과 그의 주도로 전개되었던 삼백만부흥운동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1차 자료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서 논술함으로써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삼백만부흥운동과 김치선이 재평가되고, 특히 해방 직후 교회의 재건과 함께 부흥운동사에 대한 바른 정립을 기대하는 바이다.
2. 삼백만부흥운동의 실체
고신대학의 이상규는 김치선에 대한 한국교회사에 있어서의 평가를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즉 “그(김치선)는 한국교회를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 신학으로부터 지키고 순수한 복음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이런 그의 일생의 봉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당한 평가는 그만두고라도 무시되거나 경시되기도 했다.” 이것은 해방 이후 김치선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사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더욱이 해방 직후인 1948년 8월부터 그가 주도한 삼백만부흥운동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도 필연적이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한국장로교회의 3차 분열 이후 그는 주류 교단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한 결과 역사에서조차 소외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가 주도한 삼백만부흥운동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그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필자는 “삼백만부흥운동의 성격과 실체에 관한 연구”에서 ‘삼백만부흥운동’을 “김치선과 남대문교회, 그리고 교계의 주요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동참하는 복음전도운동”으로 규정했다. 김치선은 해방 직후 한국교회에 직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삼백만부흥운동을 전개했다. 그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이상규는 교권을 통한 교회재건이나 신학적인 주도권을 통한 재건이 아닌 “제3의 길인 전도운동 혹은 구령운동”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김치선이 주도한 삼백만부흥운동은 순수한 복음전도를 통해서 민족구원과 구국(救國)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치선은 삼백만부흥운동의 취지문에서 다음과 같이 부흥의 날을 말하고 있다.
快哉 이 江山 三千里에 復興의 날이 왔다. 自由의 종소리 大地를 울리매 하늘엔 五色구름이 나타나고 山谷엔 倭松은 枯死하나 우리 松은 더욱 靑靑하고 茂盛하며 原野엔 栢谷이 대풍이니 宇宙가 함께 祝賀함이 아니랴
여기서 그의 표현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전개하고자 하는 운동과 민족, 내지는 구국의 문제를 별도로 의식하지 않고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快哉 이 강산 三千里에 復興의 날이 왔다.” 이 표현은 해방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으니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날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표현하고 있는 ‘부흥의 날’은 곧 ‘해방의 날’이고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족과 국가를 부흥운동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부흥운동은 곧 구국을 위한 운동이라는 등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2.1 삼백만부흥운동의 성격
김치선의 삼백만부흥운동은 성격상 구령(救靈)과 구국(救國)의 의미를 동반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용어 “삼천만” 또는 “삼천리”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 두 용어는 분명히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이 그의 삼백만부흥운동의 취지문에 등장하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그가 전개하는 부흥운동은 복음전도가 핵심이지만 복음전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삼천만과 삼천리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적 의미의 구국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의 삼백만부흥운동은 구체적으로 당시 전체 국민 삼천만의 1/10을 구원하자는 것인데 삼백만을 구원하는 것이 곧 국가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그는 “그날”과 “부흥의 날”을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맞은 날을 “그날”로, 그리고 “그날”을 “부흥의 날”로 일치시켜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방의 날’과 ‘부흥의 날’을 같이 보고 있는 그는 주어진 기회로서 ‘그날’의 기쁨과 환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날’ 즉 부흥의 날은 왓다라고 웨치는 소리에 삼천만대중이여 귀를 기우릴지어다. 이 기회를 놓지면 자유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삼백만부흥운동의 취지문의 일부인데 여기서도 ‘그날’과 ‘해방의 날’을 같이 보면서 동시에 ‘그날’은 ‘부흥의 날’인 전도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표현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의 표현 방식의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부흥의 날’과 ‘해방의 날’을 같은 시점(視點)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의 날’에 나서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는 제1차로 삼백만부흥운동을 이르켜야 할 것이 우리의 각오인 동시에 결심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해방과 함께 민족의 활로가 부흥운동, 즉 복음전도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흥운동에 참여하는 각오와 결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가 부흥운동에 동참하도록 호소하는 목적은 삼백만을 구원시키는 일이고, 그것은 곧 나라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이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국의 일을 같은 것으로 봄으로써 그의 삼백만부흥운동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2.2 삼백만부흥운동의 전개
그러면 이 운동은 언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김치선이 이 운동의 취지문에서 “우리는 제일차로 삼백만부흥운동을 이르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제일차’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생각하게 한다. 가장 우선해서 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는 이 운동이고 다음에 이어지는 운동이 있다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표현은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삼백만부흥운동이 단회적인 하나의 기획된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1945년 8월 해방과 더불어 김치선의 의식에 있었던 애국심과 복음을 통한 구국의 일념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개된 전도운동이다. 삼백만부흥운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구국이라는 목적과 닿아있다는 말은 복음전도가 곧 구국의 길이라는 그의 의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단순한 의협심에 나온 것이 아니다. 그의 성장과 사역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국가적 비극과 그것을 현장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즉 그는 두 번의 옥고(獄苦)를 치르는데 한번은 함흥의 영생학교 시절에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고, 또 한 번은 미국유학을 마치고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조선말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애절함과 간절함, 그리고 결의에 찬 호소로 이 운동을 이끌었다.
이 운동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마무리 되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시작은 있었지만 끝나지 않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기획되었으며 그해 말부터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제1기 1946년 3월 말까지, 제2기 1946년 10월 말까지, 제3기 1947년 3월 말까지, 그 이후 제4기는 삼백만 신도를 목표로 하는 대형집회를 전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운동은 해방 직후부터 준비하여 시행했다. 그리고 서울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전개한 운동이었다. 또한 몇몇 사람에 의한 운동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와 신자들이 동참하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글에서 처음 밝혀지는 것인데 새로운 사료의 발굴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 운동이 전국적인 형태로 전개된 것은 1948년 3월 1일에 발행된 삼백만부흥운동의 기관지인 ‘부흥’에 실린 “삼백만부흥전도회 전도사업개황”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전도운동을 위한 조직과 구체적인 실적으로 담고 있다.
1948년 2월 1일 현재 1.全北老會 高敞地方 金炳燁 牧師의 傳道로 5處 敎會 新設 2.京畿老會 梁錫鎭 牧師의 傳道로 敎會 新設 30萬圓 工費로 聖殿建築 建坪 25坪 信徒 長幼年 300名 今年부터 全自給 3.京畿老會 富平敎會 崔得義 牧師 傳道로 復興中 4.京畿老會 水色敎會 金禮鎭 牧師 傳道로 復興中 5. 慶南老會 固城邑敎會 傳道牧師 1人 派遺. 地方的으로 求靈熱膨脹 十一條運動하여 大成果 거둠 6.木浦老會 傳道牧師 1人 派遺 7.慶東老會 傳道牧師 1人 派遺 8.忠北老會 康準義 牧師 巡廻傳道 9.各 地方 巡廻傳道 金致善 牧師 朴薺源 牧師 姜興秀 牧師 宋台用 牧師 朴在奉 牧師 金應祚 牧師 具載和 傳道師 10.文書傳道 本會 機關誌 復興 發行
이와 같은 보고 내용은 삼백만부흥운동이 김치선 개인의 목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전개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출발은 개인의 소명과 깨달음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기에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가 그 중심에서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같은 보고서 안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부가 개척전도운동을 삼백만부흥전도회와 함께 하고 있음을 담고 있다. 즉
朝鮮예수敎長老會 開拓傳道運動
本 運動은 總會 傳道部 主催로 客年 一月頃 全州에서 열렸던 全鮮敎職者 復興會 席上에서 裵恩希 牧師가 提案한 傳道方法을 本 總會 傳道部 任員會는 滿場一致로 此案을 採用하여 이 運動을 全鮮的으로 擴大强化하기로 하고 客年 十一月 十七日 釜山으로부터 運動展開의 烽火를 들기 始作하여 總會 傳道部에 總本部를 置하고 各 老會는 地方本部를 府郡邑的으로 支部組織을 南鮮 各地에 完了하고 上京하여 本誌를 通하여 左記 要項을 發表하나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백만부흥운동은 장로교총회의 전도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중심적인 역할을 삼백만부흥전도회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삼백만부흥운동이 총회적으로 확대되었고, 총회가 주도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南鮮(남한) 각지의 노회들로 하여금 부, 군, 읍 단위의 지부 조직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삼백만부흥운동본부가 주도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운동은 이렇게 분열되기 전의 장로교단이 동참하는 부흥운동으로 전개 되었지만 6·25동란을 거치면서 장로교단의 분열과 이념적인 혼란,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조직적인 운동은 지속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치선을 중심으로 삼백만부흥운동은 계속되었다. 6·25동란 중은 물론 끝난 다음에도 혼란스러운 사회적 현실에서 김치선은 대한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헌신 전도자 양성”을 계속했으며, 연이은 장로교단의 분열과정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게 되면서 이 운동은 더 이상 주류교단과 목회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방법은 같지만 주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운동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전개한 이 운동은 성격상 단회적인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그가 목표했던 300만이라는 수자는 이미 채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인구가 300만이 채워졌을 때 이 운동은 끝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운동은 그렇지가 않다. 그가 세운 목표는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한 것일 뿐이다.
또한 이 운동은 여러 기구를 만들어서 전개했기 때문에 기구에 따라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운동을 기획하고 전개했던 조직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그 예로 “이만팔천동리에 가서 우물을 파라”고 하는 개척전도운동이다. 이 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구 대한신학교 졸업생이 중심인 예장(대신)교단의 목회자들의 의식 가운데 살아있다. 즉 대신교단의 목회자들의 의식에는 이러한 정신적 유산을 이어받아 개척과 목회에 대한 의식 준비되어있다.
다음은 “헌신 전도자 양성”을 위해 세운 대한신학교가 이 운동의 구체적인 형태로 설립되었다. 즉 대한신학교가 이 운동의 연장선에서 우물파기운동과 함께 그 우물을 팔 수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치선과 남대문교회에서 동역했고 후에 김치선의 후임으로 남대문교회 담임목사가 된 배명준의 증언에 의해서도 분명하다. 즉 “삼백만부흥운동의 전도훈련센타로서 필요성을 역설하여 당회에서 (대한신학교 설립을 위한) 찬성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아쉬운 것은 이 운동은 한국장로교회가 분열하기 전에 교단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묻히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술한 것처럼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의 과정에서 김치선이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을 역사화 하는 일을 누군가 했어야 했지만 그 일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이다.
3. 김치선과 삼백만부흥운동
삼백만부흥운동은 김치선이 계획하고 주도한 해방 이후의 민족복음화운동의 효시이다. 따라서 삼백만부흥운동을 말하게 될 때 반드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은 김치선과 남대문교회의 역할이다. 김치선은 당시 남한교회 중에서도 중심에 있었던 남대문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역사적, 교회적 사명을 자각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시켰던 것이 삼백만부흥운동이다. 준비된 사역자로서 김치선과 그가 목회하던 남대문교회는 개인이나 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전교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치선은 신학적 식견과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통해서 자신과 남대문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다.
3.1 김치선의 역할
김치선은 일제 말기인 1944년 일본에서 귀국했다. 그는 일본에서 사역하는 동안 일본의 현실과 그곳에서 한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몸으로 경험하면서 깨달았다. 그가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은 동포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통감했고 동시에 필연적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국했을 때 조선의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미국과 일본을 경험한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복음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었고, 복음을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켰다.
따라서 그는 해방과 함께 민족의 살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치기를 원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로마서 9:1~13을 본문으로 하는 “애국심”이라는 설교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 그것이 골육지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골육지친인 것을 알아” 즉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애국심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보아 김치선은 해방 이후 국가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복음을 통한 국가의 재건이었다. 그는 해방 직후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한 것과 비슷하여 진실이 결여되어 있고 죽음만 둘러싸고 있어 이 민족이 갈 길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의 현실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그는 “불교도 우리의 살 길인가 하였으나 고려는 망하였고, 유교가 참 살 길인가 하여 이황 선생은 최선을 다하였으나 참 살 길이 되지 못하고 이조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제한 그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조선의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단언하고 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믿는 길에서 조선의 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전개한 복음전도운동은 결국 국가의 재건과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주도하면서 전개한 삼백만부흥운동으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 운동의 취지문에서 부흥운동의 당위성을 민족의 해방과 복음전도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운동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즉
主人公되는 우리 三千萬의 기쁨이야 무엇에 比하랴. 더욱 四十年동안 歷史에 없엇고 다시 없을 壓迫과 奴隸의 苦痛속에서 自由의 鐘소리를 들은 우리들의 기쁨이다. 더욱 그리스도인으로는 二重三重의 苦生을 지낫다. 卽 民族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靈肉뿐만 아니라 美英의 스파이라는 嫌疑로 꼼짝달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良心대로 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第一 눈물겨운 生活의 全幅이었다. 바라던 기쁨의 消息은 별안간 空間을 울리게 되었다. 그리고 “宗敎의 自由” 이것이 우리의 눈에 나타나고 우리의 鼓膜을 울릴 때 아! <復興의 날은 왔고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넘치는 대답이 아니고 무엇이랴.
여기서 김치선이 민족의 해방과 함께 주어진 당면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해방’, ‘종교의 자유’, ‘부흥의 날’을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한 그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이어지는 취지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黑暗한 波濤우에 救援船 一隻은 나타나 <그날> 즉 復興의 날은 왓다라고 외치는 소리에 三千萬大衆이여 귀를 기우릴지어다. 이 機會를 놓치면 自由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아니 할 것이다. 이제 이 音聲을 들은 우리가 어찌 그저 잇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第一次로 三百萬의 復興運動을 이르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覺悟인 同時에 決心이다.
이 취지문은 삼백만부흥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날’은 해방의 날로서 자유를 얻은 날이지만 동시에 ‘부흥의 날’이기에 “삼백만부흥운동을 이르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각오인 동시에 결심”이기 때문이다. 김치선은 역사적 상황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를 복음전도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남대문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했다.
김치선은 해방과 함께 삼백만부흥운동의 목적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획, 실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직접 각지를 순회하면서 전국적인 ‘삼백만부흥전도회’를 조직하고 부흥회를 직접 인도하기도 했다. 이 때 부흥회는 삼백만부흥운동에 동참한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서 전국 지부와 교회들의 요청에 따라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다. ‘부흥’에 실린 소식란에 전국 각지의 집회인도자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김치선, 박재봉, 강흥수, 김응조, 송태용, 박재원, 구재화, 배은희, 김인서, 박윤선, 김응조, 이약신 등이다. 또한 김동화에 의하면 이 외에 당대 최고의 부흥회 강사로 활동한 이성봉, 손양원 목사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활동한 이들이다. 그 중에도 손양원은 김치선과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운동을 주도했다.
그가 구상한 이 운동은 구체화 되었다. 전국 지부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지부들을 통한 부흥운동은 실제적으로 기도회, 전도집회, 개척전도, 전도문서보급 등으로 이어졌으며, 그 외에도 라디오를 통한 전도와 부흥회 강사를 요청하는 곳에 파송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 이와 함께 부흥음악단을 조직해서 요청하는 곳에 파송하여 집회를 돕는 것 등의 방법을 준비하여 전개했다.
이와 함께 삼백만부흥운동의 전개는 전도대를 조직해서 긴급하게 요청되는 곳에 파송하는 일, 이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을 양성하는 일(신학교), 2만 8천 동네에 우물을 파는 운동 등으로 구체화 시켰다. 즉 그는 부흥회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은 계획대로 전개하면서 일정에 따라서, 혹은 각 지부와 교회의 요청에 따라서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삼백만부흥운동의 완성을 위한 계획을 별도로 세웠다. 그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전도대 조직과 파송, 신학교 설립, 우물파기 정신에 의한 개척전도운동 등으로 구현되었다.
3.2 남대문교회의 역할
당시 남대문교회는 남한의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 교회의 규모나 지리적 위치가 남한교회를 대표할 정도였다는 의미이다. 김치선이 이 교회에 부임한지 약 1년 반 후에 해방을 맞으면서 그가 구상한 삼백만부흥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남대문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대문교회는 삼백만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 운동에 기여한 역할이 컸다.
김치선 목사는 해방 전해에 남대문교회에 부임하면서 지도자로서 교회적 책임과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누구도 계획한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김치선과 남대문교회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왜냐하면 남대문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대문교회가 세브란스병원 내에서 시작해서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신자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는 다른 형편이었다. 즉 의사나 간호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외에도 병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이 처참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남대문교회는 상대적으로 삼백만부흥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었다.
그러한가 하면 영적인 리더십도 준비하고 있었다. 남대문교회는 김치선의 부임과 함께 남한에서 최초로 새벽기도를 시작한 교회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 역시 한국교회사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즉 남대문교회가 시작한 새벽기도는 단지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남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를 말할 때 새벽기도를 신앙의 특징으로 말 할 만큼 전국 대부분의 교회가 시행하고 있고, 새벽기도운동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더욱 남대문교회의 새벽기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남대문교회의 새벽기도가 김치선의 부임과 함께 시행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치선은 이미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물론 그가 삼백만부흥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와 함께 시행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찾아낸 김성한은 그의 글에서 “삼백만구령운동의 동력은, 이미 해방 이전 1944년부터 남대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달라며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축적된데 기인한 것이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인 준비가 한 개인 김치선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대문교회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치선은 남대문교회와 함께 자신이 구상한 삼백만부흥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남대문교회는 이 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었다. 특별히 이 운동은 해방 이후 월남하는 난민들이 남대문교회에 몰려들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월남하는 많은 신자들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남대문교회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남대문교회가 보듬어 안으면서 기도하게 한 것은 폭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열정을 동반시켰다.
김성한은 김치선이 남대문교회의 새벽기도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 “1944년부터 시작된 김치선의 눈물 목회는 해방 이전 1년여 기간에는 새벽기도회를 통해 민족의 해방을 준비하게 했고, 해방 이후 남북분단의 정치적 혼란기에는 월남 피난민들과 혼란의 와중에서 방황하던 민중들의 비애를 달래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은 김치선의 지도로 남대문교회가 새벽기도를 전개함으로 피난민은 물론 교회 구성원들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남대문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했다.
삼백만부흥운동과 관련해서 남대문교회는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부흥운동을 전개할 때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나섰고, 남대문교회 예배당은 서울 집회의 중심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인 ‘삼백만부흥전도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들도 대부분 남대문교회의 신자들이거나 남대문교회 내에 있었던 대한신학교 학생들이었다. 또한 이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도 남대문교회의 신자들의 헌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실제적인 에너지가 되었다. 당시 남대문교회의 장로로서 ‘삼백만부흥전도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유지한(柳智澣)은 헌금을 요청하는 글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삼백만부흥전도회는 세상이 아는바와 같이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발족해서 오늘의 성장을 보았고 독립한 기관이나 오늘의 성장 오늘의 유지 경영은 역시 남대문교회의 절대적인 후원과 적극적 헌금과 기도의 힘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대문교회에 감사하나이다.
이 글에서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삼백만부흥운동의 출발이 남대문교회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대문교회가 없는 삼백만부흥운동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운동의 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남대문교회 신자들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월남한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김치선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조직이 필요했고, 그 조직원인 일꾼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가 목회를 하고 있던 남대문교회는 담임목사이자 당시 한국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김치선의 제안을 허락하고 직접 동참했는데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남대문교회의 일이고, 그것은 곧 한국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둘째로는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재정도 남대문교회와 신자들이 적극 동참함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삼백만부흥전도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유지한 장로는 “남대문교회의 절대적인 후원과 적극적 헌금과 기도의 힘”에 의해서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이 운동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결코 김치선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실제로 전도대를 파견하고, 문서를 발행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전국적인 모금과 함께 그 중심에 남대문교회와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4. 한국교회 부흥사(復興史)에 있어서 의미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삼백만부흥운동의 실체를 찾아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한 이 운동은 그 후에 전개된 민족복음화운동의 효시였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삼백만부흥운동의 정신에 이러한 사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즉 삼백만부흥운동은 즉흥적, 일시적 전도운동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교회사 전체를 보면서 해방 이후 복음전도를 구원과 구국의 원리로 확신한 한 지도자가 고민하면서 계획해서 전개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삼백만부흥운동은 김치선이 계획하고 주도한 한국교회 부흥사에 있어서 해방이후 민족복음화운동의 효시이라고 할 수 있다.
4.1 1907년 대부흥운동의 계승
삼백만부흥운동의 기관지로 발행된 ‘부흥’ 제7호에 실린 이 운동의 전모(全貌)를 밝히는 글에 의하면 매우 흥미로운 제목이 있다. 즉 “1907년 대부흥광경을 재현한 삼백만부흥전도회의 추기 대부흥회의 전모”라는 제목이다.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삼백만부흥운동이 분명한 역사의식과 함께 계획,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이 운동을 계획함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효시인 1907년 대부흥운동을 전제로 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즉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조국의 앞길과 시시각각으로 확대되는 죄악의 물결속에 잠겨 들어가는 동포의 참상을 바라볼 때 눈물이 없을 수 없고 피가 끓지 않을 수 없다. 삼백만부흥전도회는 이 시급한 민족적 위기를 당면하여 대능의 섭리, 하늘의 크신 역사가 이 땅과 이 민족의 위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여졌다. 1907년 이 땅위에 임하였던 천래의 성화 성신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할 것을 통절히 느끼어 이 은혜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삼백만부흥운동이 1907년 대부흥운동을 전제로 시대적 위기의 상황에서 부흥운동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이 운동은 1907년 대부흥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계획했고, 그것을 사모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운동은 단지 사람이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며 “천래의 성화 성신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할 것을 통절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역사가 없이는 안 될 운동임을 전제하는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1907년에 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계획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운동의 결과 내지는 성과를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인데, 그 평가가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어떤 의식을 갖고 이 운동을 전개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다. 즉
팔월 삼심일일 오후 두시 대회장소인 남대문예배당의 장내에는 이천여 명의 군중이 마당에까지 넘쳐 은혜의 분위기가 서울 전포에 덮이었다. ··· 이리하여 아침으로 저녁까지 밤으로 새벽까지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한 주일이 하루같이 죄악의 속된 세상에 물든 영혼들은 은혜의 바다에 목욕하여 새생명의 기쁨과 환희를 맛보았다.
천래의 성화 하늘의 불은 떨어졌다. 군중은 새술에 취한 듯이 글자 그대로 여광여취(如狂如醉)의 상태에 들어갔다. 마치 1907년에 이 땅에 임하였던 대부흥의 광경을 다시 나타내었다.
이 보고 내용은 1947년 8월 31일 오후 2시에 남대문교회에서 열린 삼백만부흥운동 집회와 관련한 것이다. 이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예배당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 자리를 잡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집회에 참여한 신자들이 모두 “넘치는 은혜의 분위기가 서울 전폭에 덮이었다.”는 표현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삼백만부흥운동에서 나타난 현상을 1907년 대부흥운동과 연결하고 있다. 즉 이 운동을 주도한 이들의 의식에 1907년 대부흥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계획한 것으로써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운동은 이미 한국교회사에 확인할 수 있는 1907년 대부흥운동 이후에 한국교회 성장에 크게 공헌한 사경회의 성격을 갖고 전개되었다.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1907년 대부흥운동의 열기와 지속적인 은혜의 충만함과 성장을 기대했던 것이 사경회와 같은 형태의 집회를 구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집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1. 통야(通夜)기도회
예배당 안에서 자며 밤을 새워 기도하는 군중의 무리 7,8백 명에 달하여 통곡하는 기도소리가 하늘에 사모쳤다. 박재봉 목사가 인도하였다.
2. 새벽기도회
강사 이약신 목사의 인도하에 맑고 정성스럽고 신비스런 은혜의 문이 열리어 나날이 은혜의 도수는 더하여 갔다.
3. 오전공부
김치선 목사의 성신 공부가 있었는데 氏의 불같은 정열 예레미아 같은 눈물은 시간마다 군중을 뜨겁게 하고 정열의 도를 높이었다.
4. 낮 시간
박재봉 목사의 인도로 그가 받은바 전후 9년 동안의 산중 기도생활이 고귀한 체험담과 전도행의 사실을 인증할 때 군중은 한 사람 기침소리 없이 감격과 찬탄의 아멘 소리가 계속할 뿐이었다.
5. 오후 국사 강좌
강흥수 목사의 인도하에 과거 조선의 피묻은 발자취를 들춰 망국죄악의 근원을 설명할 때 누구나 인간역사의 배후에 움지기는 신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고 과거 조상의 잘못 된 거름 의인의 피로 물들인 선인의 역사를 들을 때 누구나 뼈아픈 뉘우침과 새로운 결심의 주먹을 부르쥐었다.
이것은 삼백만부흥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집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보고 내용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사경회로 볼 수 있는 성격의 집회였다. 식사와 쉬는 시간 말고는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집회인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집회는 일반적으로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떻든 이 부흥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남대문교회에 모인 2천여 명의 신자들이 24시간을 함께 하면서 기도, 찬양, 간증, 설교, 국사강좌까지 듣고 배우는 것이었다. 매일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신자만 7,8백여 명이었다는 것도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는 광경이었다.
여기서는 삼백만부흥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은 1945년 해방 직후 1907년 대부흥운동을 계승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계획된 것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1907년 대부흥운동은 새벽기도와 사경회를 낳았다면 1945년 시작한 삼백만부흥운동은 해방 이후 그것을 계승한 복음전도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삼백만부흥운동의 일환인 남대문교회에서의 집회를 평가함에 있어서 “마치 1907년에 이 땅에 임하였던 대부흥의 광경을 다시 나타내었다.”는 말로 한국교회부흥사(韓國敎會復興史)에 있어서 삼백만부흥운동의 역사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4.2 민족복음화운동의 효시
“이 민족 삼천만”이라는 말은 김치선의 또 다른 별명이라고 할 만큼 그의 문서에서 반복적이고 열정적으로 사용한 단어이다. 또한 실제로 이 말은 삼백만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출발점에 중요한 어원이 되었다. 김치선이 주도한 이 운동은 민족의 주권과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과 복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르고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치선에게 있어서 삼백만부흥운동은 곧 민족의 구령(救靈)과 국가의 재건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만든다는 것에 국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구성원으로 강건한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인식시키는 것을 복음 전도의 사명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흥」 제10호의 권두언 “민족해방의 복음운동”에 실린 내용이다.
삼천만의 가슴을 뛰게 하고 뜨거운 피를 자아내어 넘치는 감격에 몸 둘 바를 아지 못하게 하던 1945년 8월 15일! 어느 듯 봄바람 가를 비 세 번을 거듭하였으니 세월의 흐름이 참으로 덧없고 빠르다. 이 날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기념할 부림절이니(에스더 9:20~22) 마음 것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할 날이다. 악독한 왜정의 쇠사슬에서 자유해방을 받은 삼천만의 가슴 속에 어찌 깊은 감사와 기쁨이 없으랴.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처하여 있다. 남북통일의 민족적 과업이 앞에 아득히 남어 있으며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 해결이 진실로 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난국을 타개함에 급선무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이다. 복음의 위력이 아니면 이 땅 이 백성의 살길을 능히 개척할 수 없다.
이 글에서 삼백만부흥운동은 무엇을 목적으로 전개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 한 마디가 “이 난국을 타개함에 급선무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이다. 복음의 위력이 아니면 이 땅 이 백성의 살길을 능히 개척할 수 없다.”는 말에 있다. 즉 이 권두언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읽을 수 있는데 먼저 민족의 해방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다. 광복이 가져다 준 기쁨과 감격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주어진 사회적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특별히 해방 이후 좌우로 나뉜 이념적 갈등은 사회적 무질서는 물론이고 폭행과 살인, 반목이 자행되면서 지금으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을 제시한 것이 삼백만부흥운동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표현하는 “이 난국”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지적한 해방 직후 국가적으로 직면한 현실을 전제한 것이고,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문제는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답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접경지역’(분쟁지역)에 전도대를 파송한 것은 또 하나의 삼백만부흥운동의 방편이었다.
또한 삼백만부흥운동은 단지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는 것을 목적한 제한적 의미의 운동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즉 구국과 구령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글에서 알 수 있다.
지역의 38선은 터질 수 있다 하여도 죄악의 장벽을 헐지 못하면 이 백성은 영원히 구원 얻을 수 없다. 정부는 서서 대한국민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다. 땅에 있어서 선량한 백성인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무한한 축복을 누릴 자는 누구인가? 오직 악독한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 받은 자들이니 우리 신자들의 책무는 실로 중대한 것이다. 멸망의 구렁에서 헤매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힘을 합하여 구령운동에 용기 있게 나아가자.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힘써 싸워 이 민족을 깊은 죄악에서 구원하자. 이 복음운동이라야 말로 나라를 구원하는 운동이며 백성을 살려내는 신령하고 강력적인 운동이다
이 글은 역시 「부흥」10호의 권두언 “민족해방의 복음운동”에 실린 내용이다. 삼백만부흥운동이 당시의 역사적 현실, 특히 남북의 분단과 함께 사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령과 구국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방은 독립과 자유를 주었지만 그와 함께 주어진 것은 이념적 갈등과 함께 편이 나뉘어 싸우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서 해방의 기쁨은 잠시고 어떤 이념에 의해서 국가를 세울 것인가 하는 혼란이 일어났다. 이 혼란은 사회적,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를 죽이는 폭력으로 발전했다. 이로 인해서 남한 지역에서 남남간에 일어난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치선은 “이 복음운동이라야 말로 나라를 구원하는 운동이며 백성을 살려내는 신령하고 강력적인 운동이다.”고 했다. 이것은 김치선에게 있어서 이 운동의 취지에 구국과 구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운동은 해방과 함께 주어진 암울한 국가적 현실 앞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동시에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전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삼백만부흥운동은 민족을 복음화해서 국가의 미래를 강하게 세우자고 하는 꿈이 담겼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부흥사에서 이 운동은 매우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삼백만부흥운동은 민족복음화의 효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방 전까지 민족복음화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교회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민족복음화의 효시로서 삼백만부흥운동을 반드시 언급해야 하고, 이 운동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당면한 한국교회사의 과제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민족복음화라는 말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치선이 계획하고 전개한 이 운동이야말로 민족복음화운동의 효시이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부터 이어지는 부흥운동의 맥을 잇는 역사적 중간의 위치에서 허리 역할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운동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채 한국교회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놓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더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부흥」 11호의 권두언 “흥국의 기초”라는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삼백만부흥운동은 철저한 국가관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제목인 “흥국의 기초”는 곧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운동 즉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고, 동시에 그것은 삼백만부흥운동의 목적이기도 하다.
보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히 식인종을 구원하고 야만민족을 문화인으로 개조하였다. 우리 민족의 일분자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이 백성을 구원하고도 더욱 남음이 있을 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그 지역에서 충성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자. ··· 신자들은 자기의 기능과 역량을 각자의 지역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발휘하여 위기에 직면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 봉공의 정신으로 합심합력하여 용왕 매진하자.
이 글에서 첫째 복음의 능력은 “식인종을 구원하고 야만민족을 문화인으로 개조하였다”, 둘째 “복음의 능력은 이 백성을 구원하고도 더욱 남음이 있을 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셋째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 봉공의 정신으로 합심합력하여 용왕 매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의 뜻을 읽을 수 있다. 결국 민족복음화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족(국가)의 “구국과 구령”을 목적으로 하는 이 운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이미 “삼백만부흥운동의 성격과 실체에 관한 연구”에서 밝혔지만 이 운동은 단순히 전도집회만을 수단으로 한 운동이 아니었다. 수단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이 민족 삼천만”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을 민족복음화의 효시로 보는 것이 결코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운동은 그의 국가(민족)의식에서 나온 민족복음화운동이다. 그에게 나라가 없는 믿음, 나라가 없는 교회는 없는 것이었다. 그 자신이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르고, 일본에서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지배국가에서의 수모를 겪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동포끼리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배반하는 일들은 그에게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민족과 국가는 같은 개념이었고, 민족을 살리는 길은 곧 국가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민족복음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삼백만부흥운동은 곧 민족복음화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흥」 11호에 실린 방훈(方薰)의 “運動과 新生活”이라는 글이다. 비록 이것이 김치선의 글이 아니지만 그가 전개하는 운동의 대변지에 실린 것이기에 이 운동의 지향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다양한 필자가 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부흥운동을 위한 김치선의 생각을 면면히 살펴볼 수 있다.
해방 3주년인 지난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날이므로 우리 3천만 민족의 기뻐할 영원한 기념일이다. 해방에서 독립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새시대를 맛났다. 이 새시대는 구속 압박에서 자유해방으로 암흑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하게 하였으니 이 새시대를 당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깊이 든 잠을 깨어서 천재일우의 좋은 시기를 1분 1초라도 허송치 말고 전도운동에 총집중하여 구령사업에 대 활동을 전개하자.
이 글은 필자를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김치선의 것이 아닐까 할 만큼 김치선의 생각을 잘 담았다 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운동의 대변지로써 목적하는 것을 위한 글들이 실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부흥운동은 곧 독립과 해방을 통해서 주어진 새시대를 결코 다시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국가적(민족적) 기쁨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1분 1초라도 허송치 말고 전도운동에 총 집중하여 구령사업에 대 활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그가 표현하고 있는 “새시대”는 해방과 함께 주어진 국가의 현실이며, 이것은 새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해방과 함께 다시 주어진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1분 1초라도 허송치 말고 전도운동에 총집중하여 구령사업에 대 활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즉 김치선은 “구국과 구령”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위해서 민족복음화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삼백만부흥운동을 계획하고 전개한 것이다. 결국 삼백만부흥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구국과 구형”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복음화운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한국교회사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의 과정에서 김치선이 주류교단에 남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사에서 그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말았다. 둘째는 삼백만부흥운동이 전개되는 말미에 6.25동란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함으로 더 이상 조직적인 운동의 전개와 지속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6.25동란이 끝남과 동시에 장로교단의 분열은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했다. 넷째 6.25동란 이후에 김치선과 남대문교회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 즉 김치선은 1952년 말 남대문교회를 사임함으로써 그가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이 운동의 추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5.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삼백만부흥운동은 해방 이후 한국교회 재건의 역사에서 잊혀서는 안 될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운동은 1907년 대부흥운동 이후 한국교회부흥사에 있어서 해방 이후 그 역사를 잇는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교회사에서 잊혀진 사실로써 역사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지금까지 삼백만부흥운동에 대한 구전적 사실은 있었고, 그것을 한국교회사 문헌에 적시한 경우는 있지만 정작 이 운동이 한국교회사에 온전하게 기술되지 못했고, 또한 이 운동에 대한 역사적 정립이 충분하게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운동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에 아쉬운 일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운동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필자에 의해서 발굴된 것은 「부흥」 창간호, 4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가 전부이다. 그것도 보존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지라 연람자체가 어렵다. 종이가 삭아서 분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영인본으로 제작해서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하여 한국교회사에서 김치선과 삼백만부흥운동의 위치를 찾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우완용은 그의 책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와 신학’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의 글 어디에도 김치선이나 삼백만부흥운동에 관한 사실을 제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의 각주 58번에서 설명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완용의 책임이 아니다. 한국교회사에서 김치선이 소외된 것과 그의 역사적 위치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물론이고 삼백만부흥운동의 역사적 사실도 역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족복음화운동으로 표현되는 부흥운동은 1964년부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전국복음화”, 1965년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1973년 “오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1977년에 이르러 “77민족복음화운동”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때 삼백만부흥운동이 민족복음화라는 개념의 부흥(전도)운동의 효시라고 하는데 무리가 없다. 김치선이 이 운동을 계획하고 전개함에 있어서 그의 의식에 분명하게 전제된 것은 민족의 구령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구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삼백만부흥운동은 곧 민족복음화운동의 효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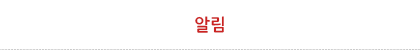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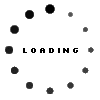
댓글0개